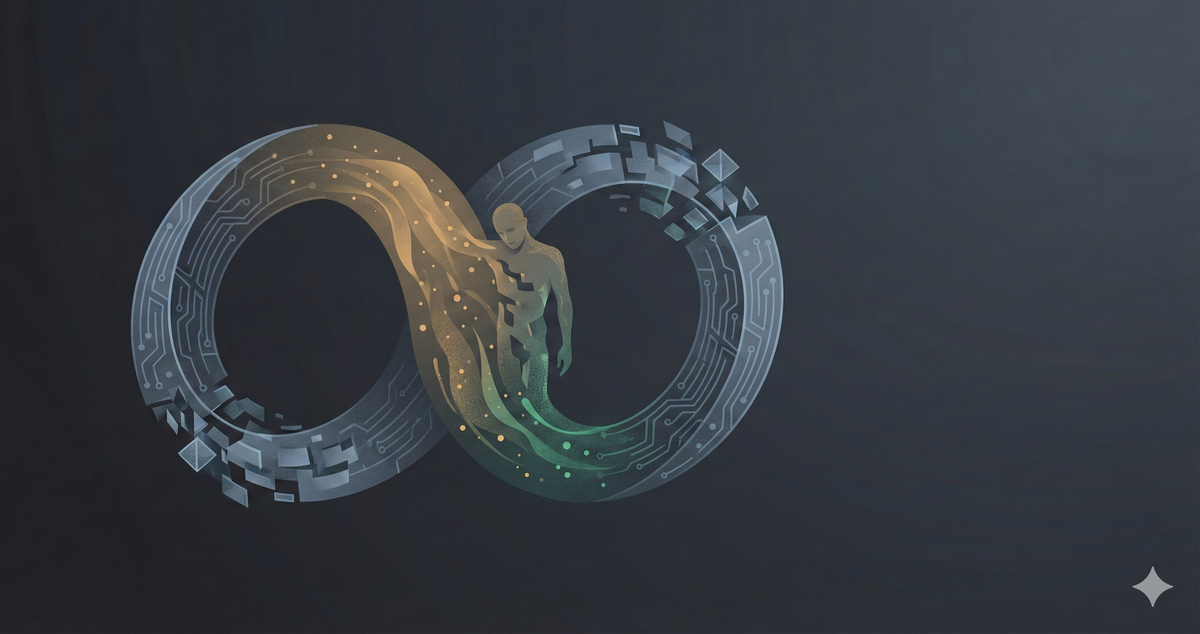워드프레스와 헤어질 결심
워드프레스를 쓰게 된지가 2007년부터니 거의 20년이 다되어가는 것 같은데, 이제는 이 느리고 고집불통인 편집 시스템과 작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상한 고집처럼 붙들고 이리저리 애를 써봤지만, 이제는 훌륭한 기능에 비해 형편없는 사용성에 대해 스스로 납득을 할수 없는 지경이다.
차단 되었다.
다가오지 말라는 말이다. 나는 평온을 흔드는 '위험한 손님'이 된 것이다. ’접근 금지 명령서’를 받아들 때의 시리고도 뜨거운 느낌이 되살아 났다. 100m 이내로 다가오면 체포-구금 될 수 있다는 설명서가 적혀있었다. 나는 아무런 항변을 하지 못했다. 나의 말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 관계는 끝내 회복되지 못하였다. 믿음이 깨어진
밤의 장막이 드리워지면 사람들은 꿈을 꾼다.
이 이야기에는 어떤 사건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의식의 흐름'이라는 기법을 구태여 흉내내려는 의도도 없지만, 이야기를 풀어놓는 주체로서의 인물은 또렷하게 상정되지 않는다. 그저 보이는 데로 이야기하고, 느끼는 데로 상상을 더하며, 제멋대로 구미를 당기는 이야기를 엮어내려 한다.
누구도 신호를 주지 않는다.
언제 어떤 차가 득달같이 달려와 옆구리를 받을지 알수가 없다. 운전대를 꽉 부여잡고 부지런히 사거리 이쪽 저쪽을 살피듯, 사람의 관계망 속에서 갈 길을 못 찾고 망설이고 있다. 뒤에 늘어선 차들이 쉴새없이 경적을 울리고 있다. 좋든 싫든 나는 이 사거리를 지나야 한다.